[114] 제10장 십간(十干)의 세계(世界) / 8. 인체(人體) 속의 정화(丁火)
작성일
2017-02-13 06:28
조회
5812
[114] 제10장 십간(十干)의 세계(世界)
8. 인체(人體) 속의 정화(丁火)
=======================
우창은 고월의 이야기가 참으로 이치에 부합이 되면서도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을 했다. 고월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듣자니 서역의 어느 과학자가 사람의 몸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기준(基準)을 만들었다고 하더군.”
“인체의 온기(溫氣)를 어떻게 측정한단 말인가?”
“유리로 된 관에다가 수은을 넣어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도록 발명을 했다는 거지.”
“오, 서역 사람들은 놀라운 물건을 만드는 재능이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람은 섭씨(攝氏)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인데, 물이 어는점을 0도라고 이름하고, 물이 끓는점을 100도로 설정을 했던 것이지.”
“섭씨라면 성(姓)이 섭인가?”
“아, 서역인들의 이름을 바꿔서 한자(漢字)로 표시한 것이라네. 원래는 ‘셀시우스(A. Celsius)’라는 사람인데, 셀시우스에서 ‘셀시’를 소리만 한자로 바꿔서 섭씨라고 표시하게 된 것이라네. 물론 그들의 기호로는 ‘℃’라고 표시한다네.”
고월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종이에 그들의 문자를 그려서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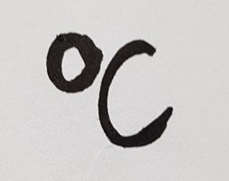
“그들의 문자는 참 묘하게 생겼군. 그렇다면 섭씨의 성에서 첫 글자를 따서 기호로 삼은 것인가?”
“그렇게 보면 되겠지? 또 다른 측정법으로는 화씨(華氏)가 만든 방법도 있으나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네. 다만 그들의 실험정신(實驗精神)과 창조력은 참으로 대단하더군.”
“고월은 참으로 박학(博學)이네. 그런 것은 어찌 안단 말인가?”
“원래 ‘널리 보지 않으면 근거를 댈 수가 없다.’는 가르침을 항상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서역의 학문에도 관심 갖게 된 것이라네. 이렇게 써먹으니 또한 좋지 않은가? 하하하~!”
“그러한 박람(博覽)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겠네. 참으로 놀랍네. 하하~!”
“온기(溫氣)를 측정(測定)한다는 것은 정화(丁火)의 크기를 객관적(客觀的)으로 수치(數値)를 만드는 것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지.”
“오,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니 이치에도 타당하다고 하겠네.”
“그렇게 만든 것으로 사람의 체온을 측정했다지 뭔가.”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다던가?”
“그가 발명한 온도계(溫度計)가 사람의 체온을 36.5도라고 읽었다는 거네.”
“그래? 오호~! 참으로 놀라운 일인걸.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도 첨에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네. 너무나 신기해서 말이지.”
“그렇다면 인체뿐만 아니라 춘하추동의 변화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물론이네. 겨울의 추위가 그냥 ‘춥다’고 하는 것에서 ‘얼마만큼 춥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렇군. 반대로 여름에는 더운 것이 얼마나 더운지도 수치(數値)로 표현한다면 더욱 명료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군.”
이렇게 두 사람이 호들갑을 떨자 조은령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눈망울만 굴리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보챘다.
“아니, 두 싸부님. 그렇게 두 분만 아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제가 소외감(疏外感)이 드는 것은 어째요~!”
“아, 그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단 말이구나. 하하~!”
“어린 제자가 이해할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알죠. 서역의 섭씨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서 사람의 따뜻한 정도를 삼십육(三十六)도 반(半)이라는 것을 밝혀냈단 말이에요?”
고월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줬다.
“령아, 잘 들어봐. 한 해는 며칠이지?”
“그야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으로 본다면, 365일이잖아요?”
“음, 그런데 체온이 36.5도라고 한다면 뭔가 집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숫자가 상통(相通)한다는 의미네요? 365와 36.5가 닮았잖아요. 아하~! 그래서 호들갑을 떠셨군요. 호호~!”
“만약에 섭씨가 물이 끓는 것에 100도가 아닌 1,000도를 표시했더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체온은 365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 놀라워요. 왜 섭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숫자는 단순히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본 것이겠지. 그리고 그는 100을 최고의 숫자로 삼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었을 수도 있고 말이지.”
“정말 재미있네요. 그렇다면 사람의 온도와 일 년의 날짜가 서로 묘하게 겹친다는 것이로군요.”
“그렇다면 땅속의 온도도 3,650도가 되겠군요.”
조은령의 당돌한 말에 두 사람은 놀란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나온다면 그것은 적어도 체온보다는 높은 온도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3만 6천 5백도이거나, 3천 6백 50도가 될 것으로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호호~!”
그 말을 듣고 우창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짝짝짝~! 과연~! 령아 다운 생각이군. 하하하~!”
고월이 다시 말했다.
“참 재미있는 기계를 만들었던 섭씨는 아마도 오래도록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군. 정(丁)의 이치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경도 스승님도 이미 이 책을 쓰실 당시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셨단 말이지 않을까?”
“우창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군. 하하~!”
그러자 다시 조은령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지 한마디 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열이 조금만 높으면 혼미(昏迷)하게 되고, 조금만 낮으면 그로 말미암아 만병(萬病)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동사(凍死)를 하게 되거든요.”
“아, 그 생각을 못 했었군. 그래서?”
“그래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추워지면 덜덜덜 떨리는 것도 그래서예요.”
“떨리는 것과 체온과 무슨 관계지?”
우창의 질문에 조은령이 웃으면서 말했다.
“몸의 근육을 진동시켜서 지방을 태워서 체온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열의 도움을 받아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 그러한 것도 황제내경에 나오는가 보지?”
“어디에서 읽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 말을 듣고 고월이 웃으면서 말했다.
“일리가 있네. 추운 날 밖에서 소피(所避)를 볼 적에 몸이 두어 번 부르르~ 떨리는 것도 그러한 이치인가?”
“호호호~!”
조은령은 재미있다고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맞아요. 임싸부의 생생한 경험도 자연의 이치에 속하는걸요. 호호~!”
“신체의 온도와 정신의 온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걸.”
“어떻게요, 진싸부?”
“몸이 차가운 사람은 열정도 식고, 몸이 뜨거운 사람은 열정도 넘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체온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걸.”
“아, 그것은요.”
물을 한 모금 마신 조은령이 말을 이었다.
“비록 보기에는 다혈질(多血質)이라고 해도 체온이 특별히 더 높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그래서 ‘왕성(旺盛)해도 불렬(不烈)하고, 쇠약(衰弱)해도 불궁(不窮)한다.’는 경도 스승님님의 말이 참으로 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석구석에서 인체와 연관이 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관점이로군.”
숫자들이 교묘하게 서로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기가 막혀하는데 고월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자고 재촉하여 눈길을 돌렸다.
“보자. ‘여유적모’라, ‘큰어머니가 있다면’이라는 뜻이니, 이것만으로는 의미하는 바가 없으니 다음 구절까지 가야 하겠는걸.”
“그렇군,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했지?”
“다음은 ‘가추가동’이라고 되어있으니 ‘가을이나 겨울이나 모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군.”
마지막 구절을 듣고서는 조은령이 무릎을 쳤다.
“맞네요~!”
조은령의 반응에 고월이 물었다.
“령아는 또 뭘 생각했기에 그러는가?”
“당연하잖아요. 정(丁)은 힘을 내는 연료(燃料)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모(嫡母)가 있으면 가을이든 겨울이든 다 좋다고 한 것이겠죠?”
“아, 그것을 생각했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상한 글이 들어있는 걸.”
“예? 뭐죠?”
“바로 이 ‘적(嫡)’자가 왜 거기에 들어있는지가 아리송하단 말이야?”
“적모(嫡母)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어머니를 적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큰어머니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생모(生母)와 적모(嫡母)의 차이가 뭘까?”
고월의 질문에 우창이 자기 생각을 말했다.
“원래 적모는 부친(父親)의 정실(正室)을 말하는 것이니까 생모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계모(繼母)라고 할 수 있겠지?”
“아마도 그렇게 봐야 하겠지. 그런데 왜?”
“그러니까 왜, 정(丁)에게 생모가 아닌 계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경도 스승님이 했을까?”
“아, 그렇군. 맞아~!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것은 나를 생하는 것에서 음양이 다르면 정인(正印)이라고 해서 생모(生母)라고 말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偏印)이라고 해서 계모의 유상을 취하기도 하네.”
고월의 말을 듣고 우창이 생소한 말에 다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용어인가? 편인과 정인이라니? 도장에도 바른 도장과 치우친 도장이 있단 말인가?”
“엉? 아, 그건 다음에 나오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하하하~!”
고월이 다음에 나온다는 말을 하자 우창도 더 묻지 않고 넘어갔다.
“아, 그렇다면 정(丁)은 갑(甲)이 아니라 을(乙)이 필요하단 말이지 않은가? 그렇지?”
“맞아, 그 말이지.”
그러자 조은령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입술을 달싹였다. 그것을 발견한 우창이 조은령에게 물었다.
“어디 여기에 대해서 령아의 이야기를 좀 청해 볼까”
세심한 우창의 기지로 조은령에게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녀는 우창을 바라보고 한 번 방긋 웃고서 말을 했다.
“고마워요. 령아의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서도요. 상화(相火)는 외부의 화라서 연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군화는 내부의 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야만 꺼지지 않고 유지를, 아까 몇 도라고 했죠?”
“36.5도~!”
우창이 장단을 쳐주자 바로 받았다.“
“예, 맞아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료를 주입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세 끼의 밥을 먹는 것이고,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죠.”
그 말을 듣고 고월이 감탄하면서도 의문이 생겨서 말을 받았다.
“오호~! 그렇구나. 그런데 갑(甲)은 왜 연료가 안 되는 것일까?”
“에구 참, 임싸부도, 갑은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불타는 것을 더욱 잘 타게는 해 주지만 연료는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죽은 나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의 연료가 된다는 말이고, 사람에게는 음식물이 된단 뜻이로군. 그런가?”
“옙~! 맞아요~!”
그제야 우창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다.
“알았어. 그러니까 생모(生母)인 갑(甲)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계모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계모인 을(乙)이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로구나.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포을이효’라고요. 을(乙)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한 을(乙)의 보답(報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요? 호호호~!”
“과연 그렇군. 하하하~!”
우창도 마주 보면서 웃었다. 그러자 고월이 정리를 했다.
“세상 밖에는 상화(相火)인 태양(太陽)이 있어야만 만물(萬物)이 소생(甦生)하여 화려한 자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인간 안에서는 군화(君火)인 심화(心火)가 있어서 궁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맥박(脈搏)이 뛰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로군.”
이 말을 받아서 우창도 거들었다.
“신(辛)의 탐욕을 다스리고, 신(辛)의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밝히는 것처럼, 정(丁)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물이 되어서 인간의 무명(無明)을 지혜(智慧)롭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니 얼마나 고마운 불인가.”
그러자, 조은령도 질 수가 없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몸의 상하와 좌우를 혈액이 감돌 적에 뜨거워진 피는 밖으로 나가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식은 피는 엉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심장으로 불러들이니 이것이 바로 동맥(動脈)과 정맥(整脈)의 순환(循環)이라고 하죠.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자연의 조화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나고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 하고는 마주 보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이렇게 학문의 이치에 취해서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 사람의 가슴속에서 염원(念願)으로 남았다.
이렇게 가슴속이 뿌듯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고월이 말을 꺼냈다.
“이보게 우창.”
“왜 그러나?”
“이 책을 들고 경순형님을 찾아뵈면 어떨까? 다음에 나올 구절이 무기토(戊己土)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도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귀한 가르침을 청해 보면 우리가 백날을 연구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더 나은 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네.”
“참으로 멋진 생각을 했군. 고월도 어려운 이야기라면 나는 더 말을 할 것도 없지. 령아는 오후에 다른 볼일이 있으신가?”
“아뇨~! 아니, 볼 일이야 있어도 없는 것이죠. 그 소중한 가르침의 자리에 절 빼놓고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호호~!”
“그렇다면 점심을 먹고 함께 반도봉으로 가도록 하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각기 흩어졌다. 저마다 해야 할 일들과 공부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는 오후가 되기를 기다렸다.
8. 인체(人體) 속의 정화(丁火)
=======================
우창은 고월의 이야기가 참으로 이치에 부합이 되면서도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을 했다. 고월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듣자니 서역의 어느 과학자가 사람의 몸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기준(基準)을 만들었다고 하더군.”
“인체의 온기(溫氣)를 어떻게 측정한단 말인가?”
“유리로 된 관에다가 수은을 넣어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도록 발명을 했다는 거지.”
“오, 서역 사람들은 놀라운 물건을 만드는 재능이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람은 섭씨(攝氏)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인데, 물이 어는점을 0도라고 이름하고, 물이 끓는점을 100도로 설정을 했던 것이지.”
“섭씨라면 성(姓)이 섭인가?”
“아, 서역인들의 이름을 바꿔서 한자(漢字)로 표시한 것이라네. 원래는 ‘셀시우스(A. Celsius)’라는 사람인데, 셀시우스에서 ‘셀시’를 소리만 한자로 바꿔서 섭씨라고 표시하게 된 것이라네. 물론 그들의 기호로는 ‘℃’라고 표시한다네.”
고월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종이에 그들의 문자를 그려서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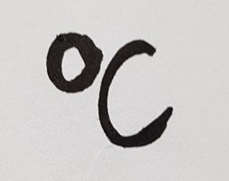
“그들의 문자는 참 묘하게 생겼군. 그렇다면 섭씨의 성에서 첫 글자를 따서 기호로 삼은 것인가?”
“그렇게 보면 되겠지? 또 다른 측정법으로는 화씨(華氏)가 만든 방법도 있으나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네. 다만 그들의 실험정신(實驗精神)과 창조력은 참으로 대단하더군.”
“고월은 참으로 박학(博學)이네. 그런 것은 어찌 안단 말인가?”
“원래 ‘널리 보지 않으면 근거를 댈 수가 없다.’는 가르침을 항상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서역의 학문에도 관심 갖게 된 것이라네. 이렇게 써먹으니 또한 좋지 않은가? 하하하~!”
“그러한 박람(博覽)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겠네. 참으로 놀랍네. 하하~!”
“온기(溫氣)를 측정(測定)한다는 것은 정화(丁火)의 크기를 객관적(客觀的)으로 수치(數値)를 만드는 것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지.”
“오,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니 이치에도 타당하다고 하겠네.”
“그렇게 만든 것으로 사람의 체온을 측정했다지 뭔가.”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다던가?”
“그가 발명한 온도계(溫度計)가 사람의 체온을 36.5도라고 읽었다는 거네.”
“그래? 오호~! 참으로 놀라운 일인걸.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도 첨에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네. 너무나 신기해서 말이지.”
“그렇다면 인체뿐만 아니라 춘하추동의 변화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물론이네. 겨울의 추위가 그냥 ‘춥다’고 하는 것에서 ‘얼마만큼 춥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렇군. 반대로 여름에는 더운 것이 얼마나 더운지도 수치(數値)로 표현한다면 더욱 명료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군.”
이렇게 두 사람이 호들갑을 떨자 조은령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눈망울만 굴리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보챘다.
“아니, 두 싸부님. 그렇게 두 분만 아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제가 소외감(疏外感)이 드는 것은 어째요~!”
“아, 그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단 말이구나. 하하~!”
“어린 제자가 이해할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알죠. 서역의 섭씨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서 사람의 따뜻한 정도를 삼십육(三十六)도 반(半)이라는 것을 밝혀냈단 말이에요?”
고월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줬다.
“령아, 잘 들어봐. 한 해는 며칠이지?”
“그야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으로 본다면, 365일이잖아요?”
“음, 그런데 체온이 36.5도라고 한다면 뭔가 집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숫자가 상통(相通)한다는 의미네요? 365와 36.5가 닮았잖아요. 아하~! 그래서 호들갑을 떠셨군요. 호호~!”
“만약에 섭씨가 물이 끓는 것에 100도가 아닌 1,000도를 표시했더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체온은 365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 놀라워요. 왜 섭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숫자는 단순히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본 것이겠지. 그리고 그는 100을 최고의 숫자로 삼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었을 수도 있고 말이지.”
“정말 재미있네요. 그렇다면 사람의 온도와 일 년의 날짜가 서로 묘하게 겹친다는 것이로군요.”
“그렇다면 땅속의 온도도 3,650도가 되겠군요.”
조은령의 당돌한 말에 두 사람은 놀란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나온다면 그것은 적어도 체온보다는 높은 온도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3만 6천 5백도이거나, 3천 6백 50도가 될 것으로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호호~!”
그 말을 듣고 우창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짝짝짝~! 과연~! 령아 다운 생각이군. 하하하~!”
고월이 다시 말했다.
“참 재미있는 기계를 만들었던 섭씨는 아마도 오래도록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군. 정(丁)의 이치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경도 스승님도 이미 이 책을 쓰실 당시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셨단 말이지 않을까?”
“우창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군. 하하~!”
그러자 다시 조은령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지 한마디 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열이 조금만 높으면 혼미(昏迷)하게 되고, 조금만 낮으면 그로 말미암아 만병(萬病)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동사(凍死)를 하게 되거든요.”
“아, 그 생각을 못 했었군. 그래서?”
“그래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추워지면 덜덜덜 떨리는 것도 그래서예요.”
“떨리는 것과 체온과 무슨 관계지?”
우창의 질문에 조은령이 웃으면서 말했다.
“몸의 근육을 진동시켜서 지방을 태워서 체온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열의 도움을 받아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 그러한 것도 황제내경에 나오는가 보지?”
“어디에서 읽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 말을 듣고 고월이 웃으면서 말했다.
“일리가 있네. 추운 날 밖에서 소피(所避)를 볼 적에 몸이 두어 번 부르르~ 떨리는 것도 그러한 이치인가?”
“호호호~!”
조은령은 재미있다고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맞아요. 임싸부의 생생한 경험도 자연의 이치에 속하는걸요. 호호~!”
“신체의 온도와 정신의 온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걸.”
“어떻게요, 진싸부?”
“몸이 차가운 사람은 열정도 식고, 몸이 뜨거운 사람은 열정도 넘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체온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걸.”
“아, 그것은요.”
물을 한 모금 마신 조은령이 말을 이었다.
“비록 보기에는 다혈질(多血質)이라고 해도 체온이 특별히 더 높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그래서 ‘왕성(旺盛)해도 불렬(不烈)하고, 쇠약(衰弱)해도 불궁(不窮)한다.’는 경도 스승님님의 말이 참으로 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석구석에서 인체와 연관이 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관점이로군.”
숫자들이 교묘하게 서로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기가 막혀하는데 고월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자고 재촉하여 눈길을 돌렸다.
“보자. ‘여유적모’라, ‘큰어머니가 있다면’이라는 뜻이니, 이것만으로는 의미하는 바가 없으니 다음 구절까지 가야 하겠는걸.”
“그렇군,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했지?”
“다음은 ‘가추가동’이라고 되어있으니 ‘가을이나 겨울이나 모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군.”
마지막 구절을 듣고서는 조은령이 무릎을 쳤다.
“맞네요~!”
조은령의 반응에 고월이 물었다.
“령아는 또 뭘 생각했기에 그러는가?”
“당연하잖아요. 정(丁)은 힘을 내는 연료(燃料)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모(嫡母)가 있으면 가을이든 겨울이든 다 좋다고 한 것이겠죠?”
“아, 그것을 생각했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상한 글이 들어있는 걸.”
“예? 뭐죠?”
“바로 이 ‘적(嫡)’자가 왜 거기에 들어있는지가 아리송하단 말이야?”
“적모(嫡母)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어머니를 적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큰어머니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생모(生母)와 적모(嫡母)의 차이가 뭘까?”
고월의 질문에 우창이 자기 생각을 말했다.
“원래 적모는 부친(父親)의 정실(正室)을 말하는 것이니까 생모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계모(繼母)라고 할 수 있겠지?”
“아마도 그렇게 봐야 하겠지. 그런데 왜?”
“그러니까 왜, 정(丁)에게 생모가 아닌 계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경도 스승님이 했을까?”
“아, 그렇군. 맞아~!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것은 나를 생하는 것에서 음양이 다르면 정인(正印)이라고 해서 생모(生母)라고 말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偏印)이라고 해서 계모의 유상을 취하기도 하네.”
고월의 말을 듣고 우창이 생소한 말에 다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용어인가? 편인과 정인이라니? 도장에도 바른 도장과 치우친 도장이 있단 말인가?”
“엉? 아, 그건 다음에 나오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하하하~!”
고월이 다음에 나온다는 말을 하자 우창도 더 묻지 않고 넘어갔다.
“아, 그렇다면 정(丁)은 갑(甲)이 아니라 을(乙)이 필요하단 말이지 않은가? 그렇지?”
“맞아, 그 말이지.”
그러자 조은령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입술을 달싹였다. 그것을 발견한 우창이 조은령에게 물었다.
“어디 여기에 대해서 령아의 이야기를 좀 청해 볼까”
세심한 우창의 기지로 조은령에게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녀는 우창을 바라보고 한 번 방긋 웃고서 말을 했다.
“고마워요. 령아의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서도요. 상화(相火)는 외부의 화라서 연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군화는 내부의 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야만 꺼지지 않고 유지를, 아까 몇 도라고 했죠?”
“36.5도~!”
우창이 장단을 쳐주자 바로 받았다.“
“예, 맞아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료를 주입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세 끼의 밥을 먹는 것이고,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죠.”
그 말을 듣고 고월이 감탄하면서도 의문이 생겨서 말을 받았다.
“오호~! 그렇구나. 그런데 갑(甲)은 왜 연료가 안 되는 것일까?”
“에구 참, 임싸부도, 갑은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불타는 것을 더욱 잘 타게는 해 주지만 연료는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죽은 나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의 연료가 된다는 말이고, 사람에게는 음식물이 된단 뜻이로군. 그런가?”
“옙~! 맞아요~!”
그제야 우창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다.
“알았어. 그러니까 생모(生母)인 갑(甲)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계모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계모인 을(乙)이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로구나.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포을이효’라고요. 을(乙)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한 을(乙)의 보답(報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요? 호호호~!”
“과연 그렇군. 하하하~!”
우창도 마주 보면서 웃었다. 그러자 고월이 정리를 했다.
“세상 밖에는 상화(相火)인 태양(太陽)이 있어야만 만물(萬物)이 소생(甦生)하여 화려한 자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인간 안에서는 군화(君火)인 심화(心火)가 있어서 궁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맥박(脈搏)이 뛰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로군.”
이 말을 받아서 우창도 거들었다.
“신(辛)의 탐욕을 다스리고, 신(辛)의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밝히는 것처럼, 정(丁)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물이 되어서 인간의 무명(無明)을 지혜(智慧)롭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니 얼마나 고마운 불인가.”
그러자, 조은령도 질 수가 없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몸의 상하와 좌우를 혈액이 감돌 적에 뜨거워진 피는 밖으로 나가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식은 피는 엉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심장으로 불러들이니 이것이 바로 동맥(動脈)과 정맥(整脈)의 순환(循環)이라고 하죠.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자연의 조화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나고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 하고는 마주 보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이렇게 학문의 이치에 취해서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 사람의 가슴속에서 염원(念願)으로 남았다.
이렇게 가슴속이 뿌듯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고월이 말을 꺼냈다.
“이보게 우창.”
“왜 그러나?”
“이 책을 들고 경순형님을 찾아뵈면 어떨까? 다음에 나올 구절이 무기토(戊己土)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도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귀한 가르침을 청해 보면 우리가 백날을 연구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더 나은 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네.”
“참으로 멋진 생각을 했군. 고월도 어려운 이야기라면 나는 더 말을 할 것도 없지. 령아는 오후에 다른 볼일이 있으신가?”
“아뇨~! 아니, 볼 일이야 있어도 없는 것이죠. 그 소중한 가르침의 자리에 절 빼놓고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호호~!”
“그렇다면 점심을 먹고 함께 반도봉으로 가도록 하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각기 흩어졌다. 저마다 해야 할 일들과 공부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는 오후가 되기를 기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