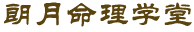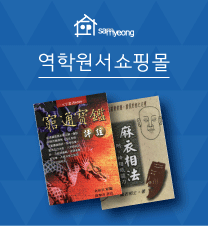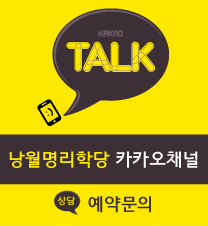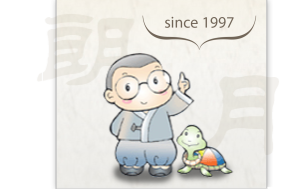[582] 제44장. 소요원(逍遙園)
25. 은원(恩怨)과 한신(閑神)
===========================
갈만이 우창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제자의 설명이 스승님의 사유에 도움이 되셨다니 이보다 큰 보람이 또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자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하~!”
기현주도 갈만에게 말했다.
“정말 훌륭한 조부님을 두셨구나. 그리고 옛날의 그 조부가 곧 오늘의 광덕일 수도 있겠어. 집단무의식에서 본다면 말이야. 오늘 새로운 이치를 깨닫게 되었으니 나도 감사드리겠네!”
이렇게 말하고 갈만에게 합장했다. 갈만도 말없이 합장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기현주가 우창에게 말했다.
“이렇게 깊은 이치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적천수에서 논하는 이야기들이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 공부도 그만할까?”
기현주의 말에 우창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저마다 자기의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찮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하는 것만이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장자처럼 일없는 도인이 되신다면 그때에는 모든 배움을 내려놓고 한가로이 차를 마실지라도 말이지요. 하하~!”
우창의 말을 듣고서야 기현주가 책을 펼치고 「은원(恩怨)」편을 읽고 풀이했다. 그러자 모두 심기일전(心機一轉)해서 책의 내용에 집중했다.
양의정통중유매(兩意情通中有媒)
수연요림의심추(雖然遙立意尋追)
유정각피인리간(有情卻被人離間)
원기은중사불회(怨起恩中死不灰)
‘두 사람의 정을 통하려면 중간에 매파가 있어야 하니
비록 그렇게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구나
정이 있는데 도리어 중간에 이간질하는 자가 있으면
은혜로운 중에 원한이 일어나니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읽고 풀이는 했으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걸. 동생이 좀 도와줘 봐.”
기현주가 읽었으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창을 바라봤다.
“누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글이 잘못한 것이지요. 하하하~!”
“에잉, 그렇게 놀리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야지.”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구절이 끼어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혼란만 주고 있으니 드린 말씀이지요.”
“아, 그런 거야? 난 또 내 지력(智力)이 형편없는 줄로만 생각했지. 호호~!”
“이 항목이 무엇입니까? 은원(恩怨)이잖습니까?”
“맞아! 은혜(恩惠)와 원수(怨讐)라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맞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억지로 어떻게든 꿰어맞춘다면 그렇다는 정도로 보면 되지 싶습니다. 아마도 식상(食傷)이 재성(財星)을 그리워하는데 중간(中間)에 인성(印星)이나 비겁(比劫)이 가로막고 있으면 누군가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 주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어쩐지! 역시 동행의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용신과 희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곳에서 원한(怨恨)이 생긴다는 말이잖아?”
“그렇습니다. 쉽게 해도 될 말을 괜히 멋스럽게 한답시고 칠언절구(七言絶句)까지 만들어서 늘어놨나 싶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고 상생(相生)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정을 통할 수가 없으니 바라만 보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지?”
“맞습니다. 나름대로는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의미에서 의인화(擬人化)의 방법으로 설명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혼란만 발생시키는 꼴이 된 셈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상황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합니다. 누님이 정리해 보시지요. 하하~!”
“그러니까 식신(食神)이 용신인데 약해서 비겁의 생을 원하는데 중간에 인성이 가로막아도 이간질당하는 꼴이고, 인성(印星)이 용신인데 약해서 관살의 생을 바라는데 막상 관살이 있음에도 중간에 재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장애물이 되니 이러한 것도 원한이 된다고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오히려 응용하기는 간단하잖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
“맞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만약에 인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재성이 가로막고 있을 적에 그것을 비겁이 극제(剋制)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은인(恩人)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자가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멀리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원한을 품는다고 했으나 그것은 좀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고 그냥 아쉽다고 하는 정도로 보면 될 테니까 말이지요.”
“아하! 그렇게 정리하니까 그래도 훨씬 쉽구나. 은인이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원한이 일어난다는 식의 의미는 난해하기만 하니까 말이야. 호호~!”
기현주가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한 것을 본 우창이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또 살펴보시지요.”
“알았어. 정말 공부가 술술 풀려서 너무 재미있네. 호호~!”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자 우창도 흐뭇했다. 기현주가 책을 펼치고는 다음 대목인 「한신(閑神)」편을 읽었다.
일이한신용거마(一二閑神用去麼)
불용하방막동타(不用何妨莫動它)
반국한신임한착(半局閑神任閑著)
요긴지장작자가(要緊之場作自家)
출문요향천애유(出門要向天涯游)
하사군차자의류(何事裙釵恣意留)
불관백운여명월(不管白雲與明月)
임군책마조천궐(任君策馬朝天闕)
“근데 왜 이렇게 내용이 길지? 앞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잖아?”
“정말 잘 살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몇 구절의 내용을 한 곳에 몰아놓고 이름을 ‘한신’이라고 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한신과는 의미가 사뭇 다른 내용들이 뒤섞여 있으니 말이지요. 그래서 나눠서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선은 앞의 사구(四句)에 대해서 풀이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훨씬 낫겠네. 그럼 풀이해 볼게.”
이렇게 말한 기현주가 내용을 짚어가면서 풀이했다.
‘한신 한둘은 쓸모가 없으니
쓰지 않은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
절반이 한신이라도 임의대로 내버려 두면
필요할 적에는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네.’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한신(閑神)의 의미가 뭐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가?”
기현주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표정을 짓자 우창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희용신(喜用神)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야 알지. 용신은 일간을 돕고 희신은 용신을 돕잖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구신(忌仇神)도 아시잖습니까?”
“당연하지. 용신을 극하면 기신이고 희신을 극하면 구신이니까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이쪽 편 희용신의 두 오행과 저쪽 편 기구신 두 오행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러서 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즉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간단할 것을 괜히 어렵게 생각했나 보다. 이해되고말고. 그러니까 그 한신이 하나거나 둘이 있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기현주는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희용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롭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의 구절을 보면 한신이 절반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야?”
“아, 어쩌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서너 글자가 한신일 수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놀고 있다가 중요한 대목에서는 자기 몫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한신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
“처음에는 희기(喜忌)만 관심을 두지만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신의 역할에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누님은 희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신의 동태가 중요합니까?”
“말하면 뭘 해. 당연히 용신이 중요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희기인 용신과 기신의 파악이 끝나면 동(動)하지 않는 한신에게로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처음에는 자기의 일을 잘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지만 그들이 안정되고 나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겠구나. 맞아! 그러니까 한신을 살필 정도의 안목이 된다면 비로소 오행의 이치에 밝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참 빠르게도 이해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하하~!”
우창은 기현주의 이해력이 활발한 것이 즐거워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항상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우창이었는데 기현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이 재밋거리를 찾아내는 것이며 요소요소에서 질문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창에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요긴지장(要緊之場)’은 어떤 경우가 되는 거지?”
“아, 운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지(地支)에 해(亥)가 용신일 경우에 약하다면 희신은 신유금(申酉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건 알겠어.”
“이렇게 되면 진술축미(辰戌丑未)는 기신이 되고 사오(巳午)는 구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그것도 이해했어. 그러니까 수금(水金)과 토화(土火)를 제외하고 나니까 인묘목(寅卯木)이 남잖아? 이것이 한신이라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사주의 원국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 한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지에 인묘가 있다가 운에서 진술축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그렇다면 목극토(木剋土)를 할 것은 당연하잖아?”
“이렇게 운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변신(變身)할 경우는 매우 많기에 이러한 존재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운을 살필 적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는 도움이 되는 한신이란 말이구나? 그렇다면 해로움이 되는 한신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가령 천간으로 예를 든다면, 병화(丙火)가 용신이고 강하다면 희신은 무기토(戊己土)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한신은 금이 되겠지요?”
“맞아! 화토(火土)는 희용이 되고 수목(水木)은 기구가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의 한신은 경신(庚辛)의 금이구나. 그렇지?”
“맞습니다. 경(庚)이 놀고 있다가 운에서 갑을(甲乙)을 만나면 공격할 테니까 도움이 되겠는데 반면에 임계(壬癸)를 만나면 금생수(金生水)를 하게 될 테니 이번에는 도리어 기신을 생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놀고 있던 강아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무심하게 있는 것과 조심하고 지켜보는 것과의 차이는 사소하지 않은 것이지요.”
“오라! 이제야 한신의 의미를 잘 이해했어. 용신은 길하고 기신은 흉한데 한신은 길흉의 중간에서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길흉에 큰 변수가 되니까 지켜봐야 한단 말이지? 이것은 마치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관찰이라고 하겠고, 이것을 제대로 살펴야만 비로소 사주의 여덟 글자를 잘 본다고 하겠잖아?”
기현주가 신이 나서 이해한 것을 말하자 우창이 다시 말했다.
“이제 누님은 사주를 본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하~!”
잠시 말이 없던 기현주가 우창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자평법은 그야말로 수박의 겉만 보고 판단한 것에 불과했네. 이렇게 한신의 동태(動態)를 살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비로소 이해되었어.”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도 살펴보시겠습니까?”
“아 참, 그래야지. 어디 보자~!”
잊고 있었다는 듯이 말한 기현주가 글을 보면서 풀이했다.
‘문을 나가서 천하를 유람코자 하는데
무슨 일로 비녀와 가락지가 방자하게 머무르라는가
백운(白雲)은 명월(明月)을 관제하지 않는 것이니
그대는 말을 달려 벼슬길로 나가기를.’
글을 풀이하고 나서도 또 고개를 갸웃거리던 기현주가 우창에게 물었다.
“이 대목은 앞부분의 한신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잖아? 서로 다른 글이 같은 곳에 있으니까 그것도 깊은 뜻이 있나 싶어.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지.”
“정말 문맥(文脈)을 잘 파악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이 맞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기반(羈絆)」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 이름이 사라지고서 여기에 붙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기반이라는 의미로 살피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반? 그건 뭐지? 달려야 하는 말이 줄에 묶여있다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용을 살펴봐서는 용신기반(用神羈絆)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甲)이 용신인데 기(己)가 옆에 있다거나 기(己)가 용신인데 갑(甲)이 옆에 있으면 갑기합(甲己合)이 되어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용신이 운을 만나서 성공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합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게 되니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란 말이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자가 길을 막는 거야. 남자가 여인의 길을 막을 수도 있잖아?”
기현주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하자 우창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고쳐버립시다. ‘여인이 천하에서 큰 뜻을 펼치고자 하여 문을 나가는데 무슨 일로 남자가 집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밥을 지어주지 않고 어디를 나돌아 다니느냐고 한다.’고 말입니다. 하하하~!”
“그래 맞아! 그런데 좀 일상적이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처음의 말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 호호호~!”
“그럼 그냥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한바탕 웃고는 다시 다음 구절을 물었다.
“백운(白雲)과 명월(明月)이 서로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결국은 합(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잖아?”
“맞습니다. 이 대목은 경도 선생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지 싶습니다. 깊은 통찰(洞察)과 사유(思惟)가 깃든 내용으로 보이니 말이지요.”
“그건 또 왜?”
“일반적으로 용신이 합이 되는 것을 ‘용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하게 살펴서 불길한 조짐의 상황으로 보는데 경도 선생은 그것은 다 허상일 뿐 소용이 없으니 단지 착시현상(錯視現象)일 뿐이라고 갈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착시(錯視)라면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말이야? 정말 그 정도로 합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요.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허구(虛構)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가다가는 지쳐서 돌아올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한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구나. 정말 잘 살피지 않으면 대충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나 중요한 뜻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그런데 왜 제목도 버리고 한신에 붙여뒀을까? 혹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사족 선생이나 가탁(假託) 선생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내용이 맘에 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맘에 들지는 않으나 그것이 따로 드러나게 되면 또 후학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렇게 슬쩍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의도한 바는 선의(善意)라고 할지라도 밝은 이가 보게 되면 또한 조잡한 술수(術數)라고 할 밖에요. 하하~!”
“맞네~! 나는 동생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 정말 중요한 것은 용신기반(用神羈絆)이든 일간기반(日干羈絆)이든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보면 된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괜히 간합(干合)을 핑계로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말을 채찍질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러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것은 괜히 스스로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못할지라도 그것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할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핑계를 대며 어정거리는 것은 아마도 여인의 정을 못 이겨서 냉정하게 끊고서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도 선생은 이러한 경험도 하셨다는 의미지 싶습니다. 하하하~!”
“다시 말하면, 기신(忌神)이 합이 되었더라도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니란 말이잖아? 합은 되더라도 작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테니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작용의 음양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기신이 합거(合去)되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용신이 합류(合留)한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하~!”
“정말 깔끔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괜히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네.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면 된다니 말이야. 그야말로 생극(生剋)의 의미로 정리한다는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생극이 바람직하다면 생이라고 하고, 생극을 원치 않는다면 극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극이 생극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생(生)이 극(剋)도 되고, 반대로 극이 생도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균형(均衡)과 조화(調和)의 이치만 알고 적용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와! 재미있네. 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괜히 어렵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화려하게 꾸민 것인가 싶었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화려한 글 속에서 진의(眞意)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겠네. 호호호~!”
기현주의 말을 듣고 있던 자원도 한마디 했다.
“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천상의 선녀가 노래를 부르는 듯이 음률이 아름다워서 매료되어요. 이것은 무슨 영향일까요? 신체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팔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머! 자원이 그렇게 말해 주니까 듣기에는 참 좋네. 호호호~!”
“맑고 고운 음성이야말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흡입(吸入)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자원이 듣기에 참 좋아요. 노래를 부르듯이 빠져드니 말이에요. 호호~!”
자원의 말에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이 갈만이 말했다.
“음성의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광덕이 듣기에도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니 어느 불경에서 말하는 향성보살(香聲菩薩)의 강림이신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만의 말에 기현주가 기뻐하면서 물었다.
“처음 들어보는 보살인데 이름으로 봐서는 소리가 고왔던가 보네?”
“향성 보살의 소리가 너무나 곱고 듣기가 좋아서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감화된다고 합니다. 또 관음보살의 화현이라고도 합니다. 묘음관세음(妙音觀世音)이라는 말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혼자서 했습니다만, 자원 소사(少師)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과연 누구나 느끼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 이것은 극찬(極讚)이잖아? 듣기에는 좋지만 소리만 좋으면 뭐하누. 진리를 담아서 설해야 하는데. 호호~!”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수행하시니 당연히 향성(香聲)에 진리를 가득 담아서 일체의 모든 중생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모두 그 소리를 듣고서 환희심(歡喜心)에 잠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덕담을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구나.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할 목표가 또 하나 추가되었어. 호호~!”
기현주의 말을 듣고 우창이 말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여 이치를 환하게 깨친다고 해도 성음(聲音)이 탁하고 갈라진다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감동은 반감되기도 합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귀를 막고 도망가고 싶은 소리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아마도 전생에 부처님 전에 독경을 많이 하여 음성공양(音聲供養)을 올리신 것이 분명하지 싶습니다. 하하~!”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좀 쉬도록 해. 열심히 공부했으니 또 맛있는 음식으로 몸에게도 보답해야 할 테니 말이야.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소화를 시키려면 여기까지만 공부해야 하겠어. 정말 많은 깨달음으로 자칫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고마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동생에게 고마워요. 호호~!”
기현주의 말에 자원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는데 오늘 언니가 작정하고 성찬(盛饌)을 준비하셨구나. 갑자기 허기가 지려고 해요. 호호호~!”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내일 또 이어가 봅시다. 하하하~!”
이렇게 마무리하고는 우창도 맑은 바람을 쐬려고 화원을 천천히 거닐다가 밥을 먹으라는 소호(小胡)의 외침을 듣고서 걸음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