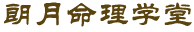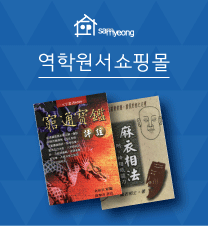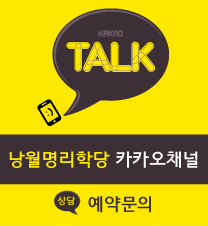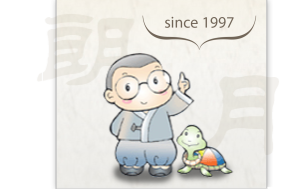[581] 제44장. 소요원(逍遙園)
24. 의식계(意識界)
===========================
우창이 이렇게 말하며 유쾌하게 웃자 갈만도 합장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기현주가 다시 갈만에게 물었다.
“알았어, 오근(五根)이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라는 것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오근이 어떻게 오식(五識)이 되는 거지? 더구나 그냥 오식이면 오식이지 또 전오식(前五識)은 뭐야? 언뜻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미묘한 것이 어렵네, 쉽게 설명해 줘봐.”
“어렵지 않습니다. 안식(眼識)으로 색(色) 그러니까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고, 이식(耳識)으로 성(聲)을 알게 되고, 비식(鼻識)으로 향(香)을 알게 되고, 설식(舌識)으로는 미(味)를 알게 되고, 신식(身識)으로는 촉(觸)을 알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만이 기현주에게 묻자 기현주도 웃으며 말했다.
“아, 그것이었어? 그야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호호호~!”
“그렇습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없지요. 하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물의 색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 여태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 가령 맹인이 모란꽃이 어떤 색이냐고 묻는다면 그에게 모란꽃이 붉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향기나 촉감이나 맛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을지언정 색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도 선근(善根)이 있어야만 말귀가 열려서 받아들이고 사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근이 없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맹인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전해주기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 그것도 말이 되네. 오근(五根)에 선근(善根)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 아냐? 호호호~!”
기현주가 이렇게 농담하자 갈만이 대답했다.
“선근(善根)도 있으니 남근(男根)과 여근(女根)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하~!”
갈만의 말에 우창도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뿌리는 도처에 있었구나. 문득 통근(通根)도 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네. 하하하~!”
“역시! 싸부는 언제나 공부밖에 몰라요. 농담(弄談)으로 던진 말도 진담(眞談)으로 만들어 버리는 재미없는 재능도 있고 말이에요. 호호호~!”
“아, 그런 거였어? 몰랐지. 하하하~!”
이렇게 모두 한바탕 웃고 나서는 다시 갈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분위기는 금세 진지해졌다.
“오근(五根)이 전오식(前五識)으로 보는 것은 신체의 감관(感官)이 우선해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관(器官)이 없다면 제육식(第六識)인 의식(意識)도 작용할 수가 없는 까닭이지요.”
갈만의 설명을 듣고 있던 기현주가 말했다.
“아니, 의식(意識)이 거기에서 나온 거였어? 처음 들어봐. 안식(眼識), 설식(舌識) 하다가 의식(意識)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생소한 느낌이 들지?”
“그것은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이것을 객관적(客觀的)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것은 또 새로운 풍경이 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배우(俳優)의 모습과 같기에 갑자기 익숙하던 것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구나. 미처 몰랐어. 유식(唯識)의 공부가 재미있는 이유가 있었네. 신기해서 감탄이 절로 나와. 호호~!”
기현주가 무척이나 재미있다고 말하자 갈만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설명을 이었다.
“전오식에 의식을 포함해서 육식(六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육근(六根)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전오식의 뿌리인 오근(五根)에 의근(意根)이 추가되는 까닭입니다. 육근의 경계에 작용이 일어나면 육식(六識)이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유식(唯識)을 말할 적에는 전오식은 아예 생략해 버리고 그 다음 단계인 육식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잘 알겠어. 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다음에는 뭘 배우게 되는 거지? 그것이 전부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냐면 생각하는 것은 의식이고 의식은 육식에 있으니 이것이면 사람에게 갖춰야 하는 전부 있잖아? 그런데도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렇습니다. 육식만으로는 완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떠나서는 다른 것을 논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일러서 육경(六境)이라고 합니다.”
“육경이면 여섯 가지의 경계(境界)란 말이잖아?”
“맞습니다.”
기현주의 말에 갈만이 동의하자 다시 말을 이었다.
“그건 나도 알 것 같은걸. 눈에 뭔가 보이면 안식(眼識)이 되고 그것이 붉은색인지 파란색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안경계(眼境界)라고 한다는 거지?”
“역시!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갈만이 동의하자 기현주도 신이 나서 말했다.
“광덕의 말을 듣고 보니 나도 가끔은 바보가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육근(六根)에서 육식(六識)이 나오고 육식에서 육경(六境)이 나온다는 말이잖아? 다시 말하면 볼 수가 없으면 색도 모르고 색을 모르니 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비록 복잡하게 설명은 했으나 결론은 간단하네. 보이면 보고 들리면 듣는다는 뜻이니까 말이야.”
“맞습니다. 학자들이 자칫하면 어렵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해하여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장치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자칫 오해(誤解)하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육경(六境)까지 이해되셨으면 유식의 공부도 절반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육경이면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겨우 절반이라니 나머지 절반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네.”
기현주가 관심을 보이며 말하자 갈만이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육경계(六境界)를 종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저마다 자기의 주장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테니 말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눈이 붉은색을 봤다고 하면 그것이 뜨거운 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코가 붉은 꽃의 향을 맡아보고 이건 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모두 헛소리라고 할 것이고 말이지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맹인모상(盲人摸象)이구나. 호호~!”
“예?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맹인 여섯이 모여 앉아서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저마다 말하는 거야. 발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말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흡사 커다란 부채처럼 생겼다고 주장하고 또 코를 만진 사람은 굵은 밧줄같이 생겼다고 주장하기를 끝없이 한다는 이야기야. 그건 못 들어봤구나.”
“코끼리를 만져본다는 말은 들어본 것도 같습니다. 과연 적절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렇게 저마다 느낀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육경계(六境界)를 의식계(意識界)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계에서 얻은 정보(情報)를 취합(聚合)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칠식(第七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정신(精神)이라고 부르는 존재일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한 것을 참 어렵게도 돌아서 왔네? 호호호~!”
기현주는 갈만의 입에서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 정도는 안다는 듯이 말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정신만 생각한다면 더 파고들 것이 없어 보이는데 칠식(七識)이라고 하고 보니까 정신의 의미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용어와 학문적인 용어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정말이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앞뒤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신기하구나. 호호호~!”
“육식(六識)을 지배하는 것을 제칠식(第七識)이라고도 하고 또 말나식(末那識)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말나’는 천축에서 이르는 것을 음차(音借)하여 한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나식이라고 하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걸.”
“그렇습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서입니다. 불교의 유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말로 의식계(意識界)라고 하는데 육식(六識)의 다음 단계이므로 의식계라고 합니다. ‘의식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식(六識)의 다음에 있는 심층(深層)의 존재라고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신이나 마음이 작용하는 그곳은 생각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말이야?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신이라고 해야 하지 싶은데 이 모두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갈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현주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같은 말인 줄로 생각했던 것들이 잠시 다르다는 생각이 끼어들면서 일어나는 혼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현주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갈만이 다시 설명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실 만하니까요. 여기에서 좀 더 정리한다면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계(意識界)에 가깝습니다. 뭔가를 의식하는 것이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무의식에 걸쳐있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그야말로 적정(寂靜)한 순간에 머무는 부동심(不動心)의 자리가 되지요. 가령 음양(陰陽)이 있으면 그 중간이 있는 이치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양(陽)이 의식(意識)이고, 음(陰)이 생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음양의 혼합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실지요?”
갈만의 설명에 기현주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음양을 비유로 설명하니 바로 이해가 되는구나. 마음은 의식계와 무의식계(無意識界)를 넘나드는 존재란 말이지?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나온 건가?”
기현주의 말에 모두 웃었다. 그 말에 공감이 되어서였다. 그러자 갈만이 다시 말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내 마음이 의식에 머물러 있을 적에는 알 것도 같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의 마음이 되면 이번에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에 스스로 자신도 잘 모르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하층(下層)에는 논리적인 의식이 있고, 상층(上層)에는 논리를 떠난 느낌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만의 말에 기현주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 맞다! 느낌이 있었지. 지금 내가 말한 ‘아! 맞다!’가 바로 그것이로구나. 그렇지?”
“그렇습니다. 느낌은 무의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칠식(第七識)이라고 하고 말나식(末那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에 가까운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精神)에 가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라고? 마음이 정신과 다른 것이었어? 난 그것도 같은 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잖아?”
“흔히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가끔은 혼동을 일으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신도 그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에는 신(神)이 없는데 정신에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신? 그 신은 또 무슨 신이야?”
“정령(精靈)의 신(神)이지요. 마음에는 신의 의미가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심층(深層)에 있는 것이 바로 정신(精神)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기현주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자신없게 말하자 갈만이 다시 설명을 이었다.
“아마도 제 설명이 어려웠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음양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을 양이라고 한다면 정신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최상(最上)에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이 되는 것이지요. 느낌은 잠시 존재하는 듯이 느껴지다가도 또 없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정신은 항상 소소영령(昭昭靈靈)하게 밝은 태양처럼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각(感覺)의 느낌과 부동(不動)의 존재인 정신(精神)의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현주는 그제야 이해되었다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하! 이제야 알겠어. 그러니까 감각은 제칠식(第七識)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정신(精神)이 있으니 이것은 제팔식(第八識)이겠네?”
“참으로 빠르십니다. 감각(感覺)을 제칠식이라고 한다면 직각(直覺)을 제팔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정신이라고 하겠네요. 다른 말로는 직관(直觀)이나 영감(靈感)이라고도 하고 신의 뜻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하~!”
갈만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 준 기현주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말하며 웃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창이 갈만에게 물었다.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완전히 마음의 세계로 빠져들어 가는구나. 그런데 제팔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 예전에도 가끔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정신과 같은 것이겠거니 하면서도 안개 속에서 물체를 보듯이 뚜렷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광덕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이해해야 하겠네.”
조용히 이야기만 듣고 있던 우창이 묻자, 갈만은 다시 긴장하면서 설명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원래 제팔식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서 이론이 분분하다고 했습니다. 조부(祖父)께서도 무의식(無意識)을 설명하고자 했다가 당시의 학자들에게서 무수한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몸에서 지각하는 존재가 포함된 신경(神經)이 느끼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깊은 곳에는 직각이 있다고 말했으니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魔鬼)의 현신(現身)’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오호! 그러셨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과연 선각자(先覺者)의 고뇌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관통(貫通)하는가 보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이야기하다가 조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울컥하는 것이 있었던 갈만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이내 진정하고 말을 계속했다.
“실로 조부이신 갈융(葛融)의 무의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무의식을 잠재의식(潛在意識)이라고도 합니다만 조부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집단무의식(集團無意識)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도달하셨던가 봅니다.”
“집단무의식? 그건 또 어떤 무의식인가?”
“무의식은 개인적으로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의 단계로 승화(承化)하게 되면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무의식에 대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무의 잎은 저마다 자신의 의식이 있지만 그 뿌리에는 모두에게 공통된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을이 깊어 가면 모두 약속이나 한 것같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나무줄기와 잎사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바로 이해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인격을 갖는 사람들이지만 어딘가에는 서로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지 않은가? 그것을 집단무의식이라고 이름으로 광덕의 조부께서 붙였단 말이구나. 정말 이름자 하나에서도 직관력이 돋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
“스승님께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달으시니 감탄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여서 제자는 그것을 이해하는데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도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원래 잘 모르던 것도 누군가와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보면 정리가 되는 것이 학문의 효과가 아니겠나? 당연하지. 나도 항상 그렇게 느낀다네. 어쩌면 이것도 집단무의식이 아닐까?”
우창이 이렇게 말하자 갈만이 흥미가 동한다는 듯이 물었다.
“설명해 주십시오. 스승님께서 느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 별것은 아니네. 가령 개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거나 벌의 행동을 지켜보면 말이지. 도대체 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자신의 생명보다는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광덕의 말을 듣고서 생각해 보니 과연 개미와 벌은 이미 생활을 집단무의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지. 그렇다면 미물이라고 해서 얕잡아 볼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개미보다도 못한 이기적(利己的)인 인간도 이미 차고 넘치는 세상임을 본다면 말이지. 하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미물(微物)도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이 놀랍거니와 인간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말인가?”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는데, 소아(小我)에 탐착하는 사람도 많지만 매우 드물게는 대아(大我)의 차원에 머물면서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의로운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의인(義人)이야말로 집단무의식 속에 머물면서 자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호! 정말 멋진 말이구나. 불가에서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을 보살(菩薩)이라고 하지 않던가?”
“맞습니다. 보리살타(菩提薩埵)라고도 하더군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미혹한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 분들에게 부여하는 호칭입니다.”
“그렇지! 보살은 집단무의식을 누리면서 중생을 위해서 헌신(獻身)하는 사람들이니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은가.”
우창의 말에 자원이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싸부, 그런데 신당(神堂)에서 신의 심부름을 하는 무녀(巫女)에게도 보살이라고 하던데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하겠는걸. 결국은 『화엄경(華嚴經)』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네. 하하하~!”
“화엄경의 이름은 들어봤으나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싸부가 그 어렵다는 불경을 어떻게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예전에 태산의 도관에 머물 적에 같이 기거하던 불제자가 있었는데 그 화상이 심심풀이 삼아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서 기억이 났을 뿐이라네.”
“그래요? 심심풀이 삼아서 듣는 이야기야말로 최상의 법문이잖아요. 어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호호~!”
자원이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우창도 잠시 생각해 보고는 말을 꺼냈다.
“난들 어려운 화엄경의 이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 그런데 그중에 하나의 품목(品目)이 있는데 「입법계품(入法界品)」이라는 거야.”
“입법계품이라면 법계로 들어가는 대목이라는 의미잖아요? 법계가 뭐죠?”
“아, 법계는 그냥 세상을 말하니까 강호(江湖)라고 해도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선재(善財)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지위(地位)는 동자(童子)였다더군. 그래서 그를 일러서 선재동자(善財童子)라고 한다지.”
“아니, 동자라면 6~7세의 어린 사내아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지위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야 모르지. 이름이 그러니까 말이네. 가령 대덕(大德), 종사(宗師)와 같이 정신세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붙여주는 이름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짐작해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純粹)하고 맑은 심성(心性)을 갖게 되는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군. 그러니까 동자위(童子位)에 도달한 수행자라고 보면 되겠지.”
“알았어요. 적어도 어린아이는 아닌 것이 확실하네요. 그래서요?”
“선재동자라는 분이 천하를 유람하면서 깨달은 이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모두 훌륭한 고승(高僧)이나 대덕(大德)이 아니라 53명의 선지식(善知識)인데 국왕도 있고 고승도 있지만 목수도 있고 상인도 있고 보살도 있고 심지어 천민(賤民)이나 매춘부(賣春婦)까지도 선지식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불교의 포용성에 대해서 감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군.”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모두가 선지식이라는 의미인가요?”
“맞아. 그것이 개미든 벌이든 국왕이든 깨달음을 얻었다면 개의치 않는다는 사상이 바로 화엄경이라고 하더군.”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왜 매춘업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도 금하는 음행(淫行)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이야기꾼이 만든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엄숙한 불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화엄경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깨달은 사람이 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느냐는 거예요.”
자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그러자 우창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집단무의식이잖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깨달음을 얻은 여인이 하는 것이 더 나쁠 이유는 없을 테니 말이야. 무슨 일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참! 잠시 잊었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물어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호호호~!”
“선재동자도 그것이 궁금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자원이 말한 것처럼 물었을 적에 그녀가 말했다더군. 음욕(淫慾)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찾아오는 남자에게 우선 그 갈증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 놓고 열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음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아내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말해준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서 사내들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며 가정으로 돌아가서 화목하게 살아간다고 하더군. 이렇게 된다면 그 선지식의 행위를 비난받아야 할까?”
우창의 말에 자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나! 화엄경에 그런 말이 있을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모든 창녀(娼女)가 그와 같다면 정말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큰 공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게 화엄경이었어요? 몰랐잖아요. 이제부터는 다시 깨달아야 하겠어요. 엄숙하고 고고한 군자의 행위만이 아니라 최하층의 천민조차도 그 속에는 불보살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선입견이 참으로 큰 장애물인 것이 확실해요. 호호~!”
“나도 처음에는 자원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집단무의식에 대한 말을 듣고서 문득 그 모두는 자연의 모습이고 깊은 곳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따름이지. 하하~!”
우창은 깨달음을 얻게 해 준 갈만을 보며 합장했다. 그러자 갈만도 도움이 되었으니 고맙다는 의미로 마주 합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