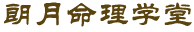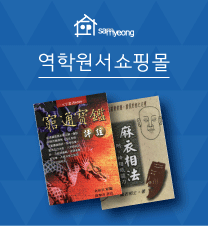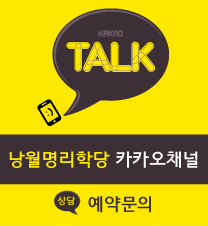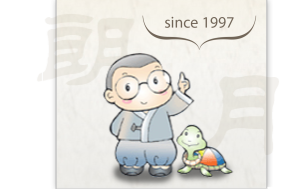[575] 제44장. 소요원(逍遙園)
18. 빈한(貧寒)과 하천(下賤)
==============================
“먼저 책을 읽어볼 테니까 또 재미있는 설명을 부탁해!”
이렇게 말 한 기현주가 빈천(貧賤)을 읽고 풀이했다.
하지기인빈(何知其人貧)
재신반부진(財神反不眞)
하지기인천(何知其人賤)
관성환불견(官星還不見)
‘빈한(貧寒)함을 알고자 하면
재성이 희용신이 아닌지를 보고
천박(淺薄)함을 알고자 하면
관성이 보이지 않는지를 보라’
글자의 뜻을 풀이한 기현주가 우창에게 물었다.
“보통 빈천(貧賤)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마치 부귀(富貴)가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말이야. 의미도 비슷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부귀의 뜻이 다르듯이 빈천도 당연히 다르니까요. 부자라도 천한 사람이 있고, 귀자라도 빈한 사람이 있으니 서로 다른 이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창이 이렇게 설명하자 기현주가 다시 물었다.
“부귀(富貴)에 대해서 글자로 풀이해 주니까 오래도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빈천도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
“당연하지요. 누님께서 풀이해 보시지요. 하하~!”
“그러니까 동생의 말은 부(富), 귀(貴), 빈(貧), 천(賤)을 따로따로 놓고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구나. 그렇지?”
“맞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겹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부자이면서 귀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일러서 부귀겸전(富貴兼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네. 그러면 우선 빈(貧)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겠구나. 글자를 보면 나눌 분(分)과 조개 패(貝)로 이뤄졌잖아?”
“그렇습니다. 먼저 분(分)을 설명해 보시지요.”
“음..... 분은 여덟 팔(八)과 칼 도(刀)로 되어 있잖아? 이것은 칼이 여덟 개라는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조개를 여덟 개로 나눈다는 말이니까 돈을 나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자원이 말한 것처럼 눈이 여덟 개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눈이 여덟 개라고 하는 것은 어색해서 어울리지 않아 보이네?”
“우창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재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의 돈을 가운데 놓고서 여덟 개로 나눈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작은 재물을 많은 사람이 나눠 갖는다는 의미구나.”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왜 칼로 나누지? 손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평온합니까? 아니면 살벌합니까?”
“평온이 다 뭐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기조차 하는걸.”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빈입니다. 작은 것을 또 나눠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혼자서 다 먹어도 굶주림을 면키 어려운데 그나마도 나눠야 한다는 것이지요. 칼을 들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의 몫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자신의 몫을 찾아야 할 정도로 매우 적은 재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창의 말을 듣고서 기현주도 공감이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칼로 여덟 가지로 나눈다는 말도 되지만, 여덟 개의 칼로 작은 재물을 나누는데 서로 많게 가지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재신(財神)이 도리어 부진(不眞)하다’고 했구나. 이 말은 희용신은 그만두고 기구신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다만 재성이 기신(忌神)이라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풀이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것은 정재(正財)와 편재(偏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
“어쩌면 사족 선생은 그런 의미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창이 보기에는 반드시 재성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용신(用神)이 무력(無力)하거나 파극(破剋)되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창의 말에 잠시 생각하던 기현주가 말했다.
“아, 그렇구나. ‘재기통문호(財氣通門戶)’도 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고 했지? 여기에서도 재성(財星)이라고 하지 않고 재신(財神)이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지?”
“맞습니다. 재신을 단순하게 재성으로 본다면 풀이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재성이 기신인 경우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다만, 재신과 재성은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재성에는 정재(正財)와 편재(偏財)의 의미를 둔다면 재신(財神)은 재물을 모으게 도는 포대화상(布袋和尙)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기현주가 궁금한 것을 물었다.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
“그야 참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테니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진신(眞神)과 가신(假神)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진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지면 비로소 그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진용신(眞用神)이 파극(破剋)이 된다면 가장 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런 사람은 수중에 재물이 쌓일 겨를도 없겠지만 또 있다고 해도 부득이한 일로 소모(消耗)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치료하는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온갖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된다면 빈한(貧寒)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창의 설명을 듣고서야 기현주는 이해가 되었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그렇구나.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었나 봐. 그래서 나온 말이,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나?”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하하~!”
“그런데 말이야.”
기현주는 문득 생각난 것이 있다는 듯이 말했다.
“왜 그렇게나 빈한(貧寒)한 팔자를 타고나는 거야? 아무리 팔자라고는 해도 남을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전생에 낭비(浪費)을 심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창의 말에 기현주가 의외라는 듯이 물었다.
“아니, 동생은 전생까지도 내다보는 거야?”
“누님도 참.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하하~!”
“지금 한 말은 그럼 뭐야?”
“그냥 가정(假定)을 해보는 것일 뿐이지요. 태어나면서 부유한 것은 부모를 잘 만나서이고 살아가면서 부유한 것은 전생에 재물을 보시(布施)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설득력이 있는걸. 그렇다면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전생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일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전생에 수행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고 가르침을 준 공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자 기현주는 우창의 말이 이해된다는 듯이 말했다.
“아하! 알겠어. 물질적으로 공덕을 쌓으면 부자로 태어나고, 정신적으로 공덕을 쌓으면 귀자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 이것은 인과법으로 봐도 일리가 있는걸. 재미있는 이야기네. 호호호~!”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부(貧富)는 물질적으로 빈곤(貧困)하거나 풍요(豊饒)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남들이 봐서는 빈곤해 보이는데 스스로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재물을 애써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왜냐하면 부유하다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수만금을 갖고서도 더 많은 금은보화(金銀寶貨)를 갈구(渴求)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일 먹을 양식만 있어도 천하태평(天下泰平)인 사람도 있으니 말이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주인은 정신(精神)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허덕이면서 쌓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는 빈자(貧者)일 것이고,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배를 채우면서 만족한다면 그는 부자(富者)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의복(衣服)이나 집의 형세(形勢)만 살펴서 빈부(貧富)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동생의 생각이야? 아니면 하충 스승님의 가르침이야? 그렇게 풀이하는 것은 다른 서책(書冊)에서 보지 못했거든.”
“맞습니다. 하충 스승님의 가르침인 ‘심리추명(心理推命)’을 읽으면서 우창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불경(佛經)이나 도경(道經)에서도 같은 의미인 것으로 봅니다. 도경(道經)은 노자(老子)나 장자(莊子)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하하~!”
우창은 하충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오호! 그러니까 성현(聖賢)의 가르침과 하충 스승님의 가르침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니 결국 하충 스승님도 성현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야?”
“남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경도 선생도 하충 스승님의 가르침을 앞선다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하하하~!”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동생이 오히려 하충 스승님보다 앞서는 것 같은걸. 호호호~!”
“누님도 참. 너무 그러시지 말고 공부에 집중합시다. 하하하~!”
우창은 기현주의 말이 민망해서 얼른 말을 돌렸다.
“아마도 누님께서 빈자(貧者)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천자(賤者)에 대해서 살펴보시지요.”
우창의 말에 다시 책을 본 기현주가 설명했다.
“천한 사람은 관성(官星)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네? 이번에는 관신(官神)이라고 하지 않고 관성이라고 했으니 정관(正官)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
“아마도 사족 선생은 그런 의도로 썼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관성(官星)은 염치(廉恥)라고 한다면 말이지요.”
“맞아! 염치가 있지. 관성이 없으면 염치가 없고, 염치가 없으면 천자(賤者)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하충 스승님의 정관에 대한 말씀은 어떤 거지?”
“예, 정관은 합리적(合理的)이고 논리적(論理的)이며 객관적(客觀的)이고 이타적(利他的)이라고 했습니다.”
우창의 말에 기현주가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비합리적(非合理的)이고 비논리적(非論理的)이며 비객관적(非客觀的)이고 이기적(利己的)인 사람은 천박(淺薄)한 사람이라고 하면 된단 말이기도 한 거지?”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십니까? 참 빠르십니다. 하하~!”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빈천(貧賤)은 알겠는데 부천(富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야. 어떻게 부유한데도 천할 수가 있다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
우창은 기현주의 말을 듣고 자원을 바라봤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느냐는 뜻이었다. 그러자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던 자원이 말했다.
“아니, 싸부가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일인데 자원이 졸고 앉아있을까 봐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래. 하하하~!”
“자원이 이해하기로는 부유하면서도 그것을 베풀 줄 모르면 천박(淺薄)한 것이고,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전념한다면 천박한 것이고, 곤궁(困窮)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서 어떻게 써야 하는 줄을 모르고 주색잡기(酒色雜技)로 탕진한다면 그것은 졸부(猝富)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도 애초에 없었던 양으로 여기고 남들에게 나눠줘 버리는 사람은 예외에요. 또 재물이 많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누가 가져 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비루(鄙陋)한 것이니 또한 천한 것이 아닐까요?”
자원이 이렇게 말하자 기현주도 바로 이해가 되었다는 듯이 말했다.
“아!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부천(富賤)한 사람도 적지 않겠는걸. 그래서 부귀(富貴)한 사람도 있지만 부천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명료하게 이해했어. 고마워 자원~!”
“글자 풀이는 안 해요?”
자원이 이렇게 말하자 기현주가 이야기에 취해서 잊어버렸다는 듯이 말했다.
“맞아! 글자도 풀이해 봐야지. 가만......”
잠시 생각하던 기현주가 말했다.
“천(賤)은 조개 패(貝)와 창 과(戈)가 겹으로 되어 있네? 여기에서 조개는 물론 재물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창을 두 개나 포개놓은 의미는 뭐지?”
“그건 자원도 모르겠어요. 싸부~ 도와주세요. 호호~!”
자원이 우창에게 떠 넘기자 우창이 설명했다.
“창이 겹쳐있는 것을 적을 전(戔)이라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것은 돈 전(錢)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황금이든 조개든 모두 귀한 재물이니까요.”
“아니, 싸부. 전(錢)은 알겠는데 천(賤)도 같은 뜻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왜 조개와 황금이 같죠?”
“아, 고대(古代)에는 색이 예쁘고 귀한 조개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화폐(貨幣)를 삼았다는군. 그러다가 나중에 금을 찾아내게 되자 그것으로 바꾼 것이지. 그러니까 흔히 요리에 쓰이는 조개와는 다른 것이었겠지. 물론 요즘에야 누가 조개로 물건을 산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천(賤)이 전(錢)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 뜻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지.”
“도대체 조개껍데기로 돈을 삼았던 때가 언제라고 아직도 그러한 글자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글자를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내게 그래? 그건 창힐 할부지께 따질 일이고, 여하튼 그런 뜻이니 그렇게 풀이할 따름인데 말이야. 하하하~!”
“하긴, 싸부의 잘못은 아니죠. 호호호~!”
“그러니까 천(賤)은 재물[貝)]이 부족[戔]한 것이고, 이것은 물질적으로 본 것이니까 너무 궁핍하면 천하게 여기는 것과 통한다고 하겠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본다면 ‘부족하다고 여길 전(戔)’이기도 하니까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의미도 되니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보면 될 거야.”
우창의 설명을 듣고 기현주가 이해되었다는 듯이 말했다.
“알았어. 만족(滿足)을 모르면 천(賤)이구나. 그렇지?”
“오호! 일리가 있습니다. 하하~!”
“만족을 알면 귀(貴)가 되고 만족을 모르면 천(賤)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의 관점이라고 하겠고, 재물을 구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물질의 관점이 된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동생 덕분에 잘 알았어. 다음의 내용은 뭐지?”
기현주가 책을 보면서 말하자 우창이 대답했다.
“길흉(吉凶)과 수요(壽夭)입니다만, 실로 허접한 이야기일 따름이니 별로 되새겨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도 없지 싶습니다.”
“그래? 그래도 하지장(何知章)인데 앞뒤의 의미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아마도 뒷부분은 인족(蚓足) 선생이 붙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하하~!”
“왜?”
“그야 길흉(吉兇)은 이미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이루면 길(吉)하고 벗어나면 흉(兇)하다는 의미를 앞에서 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요(壽夭)는 중요하지 않아? 오래 살 팔자와 단명할 팔자도 있을 테니까 말이지.”
“그런 팔자는 없습니다.”
“뭐야? 이건 예상 밖인걸. 설명이 필요해.”
“그렇다면 읽어보시고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하하~!”
우창의 말에 기현주가 다시 책을 보며 읽고 풀이했다.
하지기인길(何知其人吉)
희신위보필(喜神爲輔弼)
하지기인흉(何知其人兇)
기신전전공(忌神輾轉攻)
‘그 사람이 길한 것은
희신이 보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흉한 것은
기신이 돌아가며 공격하는 것이니라’
길흉(吉兇)에 대해서 읽고 풀이한 기현주가 우창에게 말했다.
“내용을 읽어봐서는 특별히 문제로 삼을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기현주의 말에 우창이 대답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말을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될 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누님이 생각하시기에 쓸만한 말이 있습니까?”
“희신(喜神)은 뭐지? 이런 말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이야.”
“용신이나 용신을 보조(補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필(輔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용신이 중요한 줄을 알았다면 용신을 돕는 글자이니 그에 못지않게 좋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소중한 용신을 희신이 보필하고 있으니 좋을 수밖에 없구나. 마치 왕이나 장수의 옆에는 정승(政丞)과 부장(副將)이 보필하면 왕이나 장수가 일하는데 편리한 것처럼 말이야. 그렇지?”
“당연합니다.”
“그러면 기신(忌神)은 용신을 극(剋)하는 오행인데 그냥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줄줄이 공격한다니 참혹하잖아?”
“그렇습니다. 하하~!”
“동생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비록 없어도 될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있어도 과히 탓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인족(蚓足)이라고 합니다. 군더더기이기는 하지만 있다고 해서 뜯어내야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길흉(吉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 분명히 밝힌 공덕은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하~!”
“그런데 용신이 있으면 그 옆에서 생(生)하는 것이 희신인 건 맞지? 이것이 늘 혼란스럽던데 이참에 동생이 명쾌하게 풀이해 줘.”
기현주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묻자 우창이 대답했다.
“때론 생(生)이 희신이고 또 때로는 설(洩)이 희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렵다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간단합니다. 용신의 옆에서 한 글자가 생하면 그 글자가 희신입니다. 왜냐하면 용신을 한 글자가 생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마치 대웅전에 부처가 있으면 보처(補處)가 좌우(左右)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왕(王)이 있으면 좌의정(左議政)과 영의정(領議政)이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생할 필요가 없이 이미 희신이 탄탄하게 갖춰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용신을 설하는 것이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뭐야?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어?”
“원래 알고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용신이 시간(時干)이나 시지(時支)에 있다면 자리가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두 생할 경우에만 생하는 오행은 필요 없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시간(時干)에 관살(官殺)이 용신이라면 시지(時支)의 재성(財星)은 필수적(必須的)으로 희신이 되는 것이지요. 허약한 용신은 무슨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현주는 열심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명료하지 않은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을 보고 다시 부연설명을 했다.
“시지(時支)에 용신이 있을 경우에는 일지(日支)와 시간(時干)이 용신을 생하는 인성(印星)이라면 희신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시 용신을 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신은 용신을 설하는 글자가 담당하게 되지요.”
“아무리 그래도 용신을 설하는 것은 좋을 것이 없을 테니까 흉한 조짐이잖아? 용신은 강할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맞습니다. 다만 이미 강하다면 더 강한 것은 옥상옥(屋上屋)이지요. 쓸데없는 일을 수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설하는 용신의 식상을 희신으로 삼는 것은 용신을 공격하는 관살(官殺)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켜줘야 하니까요. 옆에 좌우정승이 있다면 더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외적(外賊)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변방을 굳건하게 수비(守備)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용신이 허약하면 국경의 변방까지 돌볼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용신의 인성(印星)을 급히 구할 따름이지요.”
우창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하던 기현주가 비로소 이해되었다는 듯이 말했다.
“아하! 그러니까 용신의 주변에 용신의 인성이 하나도 없다면 외롭기 그지없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이란 말이잖아? 정말 설명을 듣고 보니까 희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네. 인성 둘이 지켜주면 등을 완전히 가려주는 가림막을 얻어서 안전한 것이고, 인성이 하나가 지켜준다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쪽만 지켜주는 것과 같아서 뒤쪽의 바람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
“누님도 이제 희신에 대해서는 졸업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하~!”
“나도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용신의 강약에 대해서 상황을 봐서 생하는 것이 희신이기도 하고 오히려 부담되기도 한단 말이었네.”
“길흉으로 인해서 희신을 이해하셨으니 인족 선생의 공덕입니다. 하하하~!”
“맞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옳은가 보다. 호호~!”
“길흉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우창의 말에 기현주가 책을 펼쳤다.